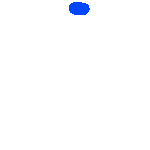주요 비즈니스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재정 확장 요구가 야기한 구축효과
2025.05.30
트럼프 관세정책은 재정 확장 → 구축효과(=금리 상승) 우려 자극
美 국채 수급 불균형은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트럼프발 재정 팽창은 금리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
트럼프 관세정책은 재정 확장 → 구축효과(=금리 상승) 우려 자극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은 재정 확장 요구로 이어졌다. 미국의 감세정책과 비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공통적인 구축효과(=금리 상승) 우려에 노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정 요구과 트럼프 관세발 재정 요구의 부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 국가부채 부담 정도가 가중됐고, 2) 인플레이션 압력도 잔존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국채금리의 동반 속등은 재정적자 가중에 갖는 시장의 높은 민감도를 반증한다. 채무한도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 국채 수급 관점에서 금리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美 국채 수급 불균형은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트럼프 정책발 구축효과에 따른 미국 금리 상방 리스크는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됐는데, 최근 미국 국채 불안은 누적된 정부부채(GDP 대비 124%)에 기인한다. 누적된 국가부채와 높은 수준의 발행금리는 구축효과 우려를 가중시킨다. 올해 2~3분기 미국 중장기채 발행 계획은 늘어났고 TCJA 영구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다.
트럼프 감세안과 재정적자 확대(국채 발행)가 상수라면 수요가 구축효과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된다. 연준은 ‘22년 중반부터 만기 상환 국채를 제한적으로 재투자하며(QT) 보유 잔액을 줄여왔다. 4월 이후 cap(월별 상한)을 50억달러로 낮췄으나 국채 순매입은 여전히 0이므로 금리 상방 리스크가 잔존한다. 트럼프 정책 불안에 외국인 달러채권 매도 압력도 우려스럽다. 최근 달러-채권 동반 약세는 美 자산 신뢰 약화를 반영해 외국 연기금의 USD 자산 선호도를 낮춘다.
트럼프발 재정 팽창은 금리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
금리 상방 리스크 완화 요인도 존재한다. 1) 하반기 美 금융규제 당국의 은행 SLR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이는 월가 은행들의 국채 매입 여력을 확대시켜 국채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2) 경기 둔화 우려의 점증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역시 금리 급등을 제약한다. 3) 美 국채를 대체할 자산이 부재하다. 10년물 기준 4.5%대 이상에서 여전히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다.
자산전략 차원에서 ‘금리 상승/하락=risk off/on’의 전통적인 공식보다 ‘트럼프발 재정 팽창과 수급 불균형→금리 밴드 상향’의 구조적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 재정/금리 우려 속 USD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비미국 자산 선호(패시브 수급)가 두드러질 수 있다. 2) 채권 투자는 자본차익 중심에서 이자수익으로의 이동이 예상되고, 3) 시계열을 하반기로 좁혀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독일과 같은 비미국 채권이 유리할 수 있다.
美 국채 수급 불균형은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트럼프발 재정 팽창은 금리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
트럼프 관세정책은 재정 확장 → 구축효과(=금리 상승) 우려 자극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수요 위축은 재정 확장 요구로 이어졌다. 미국의 감세정책과 비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라는 서로 다른 이유로 공통적인 구축효과(=금리 상승) 우려에 노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정 요구과 트럼프 관세발 재정 요구의 부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 국가부채 부담 정도가 가중됐고, 2) 인플레이션 압력도 잔존한다. 최근 미국과 일본 국채금리의 동반 속등은 재정적자 가중에 갖는 시장의 높은 민감도를 반증한다. 채무한도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 국채 수급 관점에서 금리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美 국채 수급 불균형은 금리 상방 요인으로 작용
트럼프 정책발 구축효과에 따른 미국 금리 상방 리스크는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 이후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됐는데, 최근 미국 국채 불안은 누적된 정부부채(GDP 대비 124%)에 기인한다. 누적된 국가부채와 높은 수준의 발행금리는 구축효과 우려를 가중시킨다. 올해 2~3분기 미국 중장기채 발행 계획은 늘어났고 TCJA 영구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야기할 위험을 내포한다.
트럼프 감세안과 재정적자 확대(국채 발행)가 상수라면 수요가 구축효과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된다. 연준은 ‘22년 중반부터 만기 상환 국채를 제한적으로 재투자하며(QT) 보유 잔액을 줄여왔다. 4월 이후 cap(월별 상한)을 50억달러로 낮췄으나 국채 순매입은 여전히 0이므로 금리 상방 리스크가 잔존한다. 트럼프 정책 불안에 외국인 달러채권 매도 압력도 우려스럽다. 최근 달러-채권 동반 약세는 美 자산 신뢰 약화를 반영해 외국 연기금의 USD 자산 선호도를 낮춘다.
트럼프발 재정 팽창은 금리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
금리 상방 리스크 완화 요인도 존재한다. 1) 하반기 美 금융규제 당국의 은행 SLR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이는 월가 은행들의 국채 매입 여력을 확대시켜 국채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2) 경기 둔화 우려의 점증과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역시 금리 급등을 제약한다. 3) 美 국채를 대체할 자산이 부재하다. 10년물 기준 4.5%대 이상에서 여전히 견조한 수요가 확인된다.
자산전략 차원에서 ‘금리 상승/하락=risk off/on’의 전통적인 공식보다 ‘트럼프발 재정 팽창과 수급 불균형→금리 밴드 상향’의 구조적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 1) 미국 재정/금리 우려 속 USD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비미국 자산 선호(패시브 수급)가 두드러질 수 있다. 2) 채권 투자는 자본차익 중심에서 이자수익으로의 이동이 예상되고, 3) 시계열을 하반기로 좁혀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확대 여력이 제한적인 독일과 같은 비미국 채권이 유리할 수 있다.